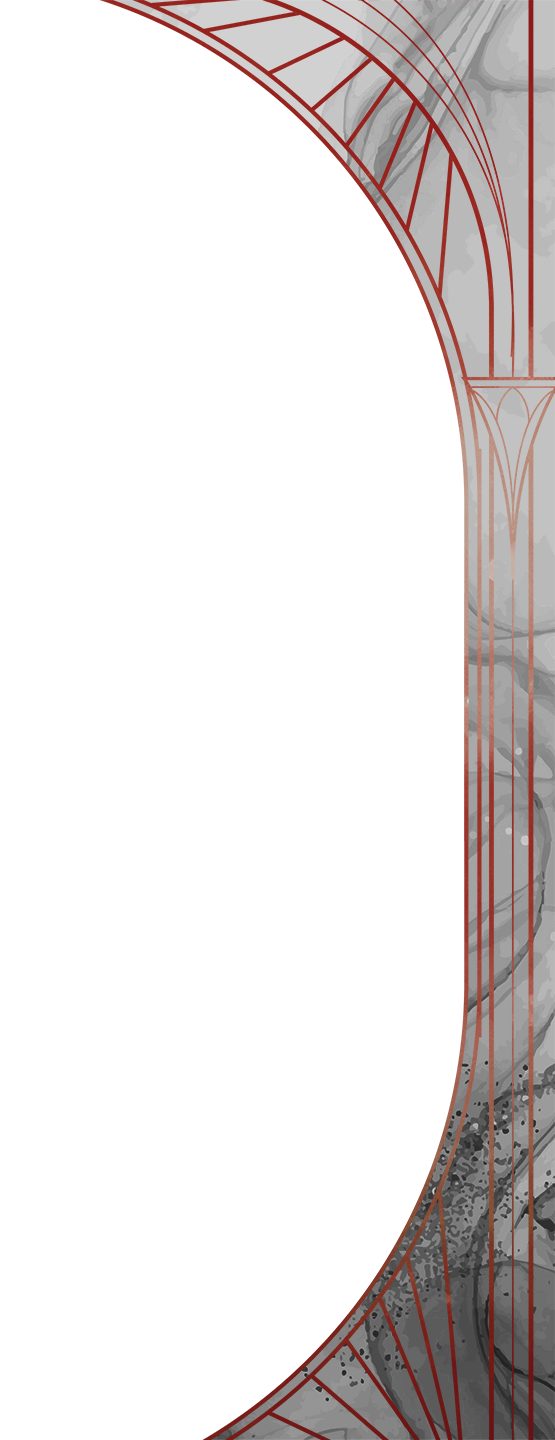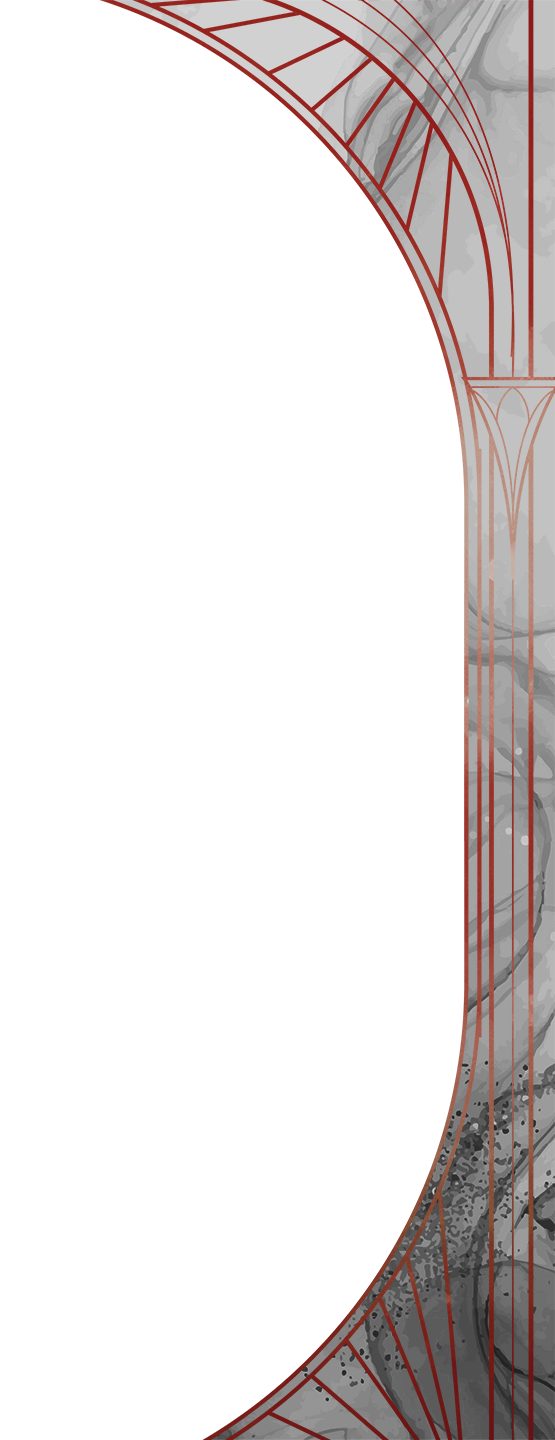“그 반찬 좋아하나 보다.”
아카리의 말에 토아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다. 아카리는 아무렇지 않게 오리엔탈 드레싱을 가득 뿌린 두부샐러드를 입에 넣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가 평소와는 달리 당황함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 아카리는 입에 넣은 음식물을 오물오물 씹다가 삼키고는 입을 다시 열었다.
“내가 혹시 이상한 말한 거야?”
“아니, 그냥 아카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놀라서.”
놀랄 게 있나? 아카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눈으로 차려진 식탁을 보면 별 다른 거 없는 저녁 밥상이다. 늘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아카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차려져 있는 식탁이었고, 그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 만든 게 아닌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해서 토아가 만든 것들 투성이었다.
다진 참치회, 함께 싸 먹을 수 있는 한국 김, 두부가 들어간 샐러드, 피망과 숙주 절임, 참치와 쪽파를 버무린 무침, 따뜻한 미소 된장국 등 몇 가지 반찬들이 올라와 있는 크림색 식탁은 언제나 보았듯이 그의 성격이 담겨 정갈하고 질서정연했다. 그러나 그 통일감이 느껴지는 그릇들에 담겨 있는 것은 영양과 취향을 생각해서 만든 늘 보았던, 그렇지만 애정이 가득한 밥상이었다. 그리고 아카리는 밥을 먹다가 토아가 유독 젓가락을 많이 옮기는 반찬이 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었다.
“놀랄 게 무어 있어 내 사랑. 사람마다 취향이란 게 있는 거잖아. 토아는 늘 식당에 가도 토아가 먹고 싶은 거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시켜서 나누어 먹고는 하니까 무얼 특히 좋아할까 늘 고민했는데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기쁘기만 해.”
아카리는 방긋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정작 그가 느끼는 감정은 자신도 모르는 취향을 알았다는 놀라움보다는 그래,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에서 배어 나오는 기쁨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관심이라곤 일언반구도 없었다. 기실, 그는 그의 취향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개인의 취향으로 스스로 개성을 뽐낸다지만 그에게 있어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아카리뿐이었다.
아카리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 좋았고 자신의 옷장 속의 옷들도 아카리가 선물한 옷, 아카리가 잘 어울린다고 한 옷, 아카리의 옷과 맞춰 입을 수 있을 만한 무던한 종류들이 많았다. 부모님의 교육과 집안의 분위기에 옷들은 단정하고, 요란한 것이라곤 없었으나 그는 그것이 자신의 호불호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무튼 그의 직장은 정장을 선호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교복, 그리고 사복은 어른들이 사다가 옷장에 넣은 것을 입을 뿐이었다.
살아오면서 그는 그가 원해서 혹은 그의 눈에 담겨 고른 것들이 많지 않았다. 아카리를 만나기 위해 그 시간을 살아온 것 같았고, 이제 만난 그의 삶의 주인은 아카리였으므로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아카리 옆에 있기에 부끄럽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내면 그만이었다. 스스로에게 이렇다 할 확고한 취향이 없어서 도리어 다행이라고 생각도 했다. 반투명한 유령은 마치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벌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향해 따라가는 삶이 몹시도 행복했다.
“그런가? 그냥 별생각 없이 먹던 건데 나도 실은 좋아하던건가봐.”
그래서 그렇게 무감하게 관망하고 지나치는 인생을 살아왔으니 아카리의 말이 크게 닿지 못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거지 그는 자신에 대해 퍽 알고 있었다. 두 단어는 상충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기호에 관심이 없는거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타인에게 무너지지 않는 이라서 아카리의 말 하나하나에 흔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쓰러지지 않는 기둥이 자리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차피 그저 영양 섭취에 지나지 않은 행위인데, 그냥 밥그릇이랑 가까워서 젓가락이 많이 간 거겠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걸 구태여 입 밖으로 내어 덧붙이기에는 아카리가 그런 삭막한 말은 하지 말라고 울상을 지을 게 뻔했다.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싶었지, 슬퍼하게 만드는 꼴사나운 남자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고르고 골라 말을 이었다.
물론, 자신 때문에 우는 아카리의 모습 또한 사랑스럽겠지만 매정한 말에 연인을 울리는 건 꼴사납지 않은가. 그는 호감을 얻을만한 화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속삭이는 언어를 아카리는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속뜻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아카리는 이쁘게 웃었다.
“정말? 나, 토아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기뻐.”
“나도 아카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정말 기뻐. 그래서 아카리의 취향에 맞춰주고 싶어. 네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솔직히 이실직고할 의사는 없었다. 좋은 단어로 예쁘게 포장해서 그의 의사를 밝히면 순한 아카리는 포장지를 깔 생각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했다. 자신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사였다. 이 단순한 해프닝을 이만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 아카리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했는지 그녀의 일상을 물어볼까 고민하던 중에 아카리가 입을 열었다. 진주가 도르륵하고 유리판을 굴러가는 듯한 맑은 음색이 귓가를 울렸다.
“그럼 토아가 좋아하는 건 내가 만들면 되겠다.”
아카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전히 화제가 이어졌다. 시즈루 토아에게는 그저 우연이며 별 대수롭지 않았던 행동이 아카리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늘 궁금해하는 것처럼 아카리 또한 그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 아카리는 토아가 그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만 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 또한 그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주고 싶었다. 늘 받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 나도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언제나 토아는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고는 네가 무얼 바라는지 물어보면 그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뺨을 어루만져주며 속삭여. 아카리 나는 네가 기뻐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해. 그러니 그냥 지금처럼 내가 주는 것에 기뻐하고 행복하게 내 곁에 있어 줘.
그러니 아카리에게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가장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나와 당신이지만 진실로 늘 당신이 궁금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만들고, 토아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고. 그러면 더 같이 먹는 시간이 즐겁지 않을까? 난 토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걸?”
반찬을 젓가락으로 덜어주며 그녀는 덧붙였다. 사랑을 하는 여자의 애정을 담아 상대를 마주하는 눈동자였다. 토아는 빨간 동공에 자신이 상에 맺히는 걸 좋아했다. 제 머리와 닮은 붉은 색이니 꼭 마치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이질적이지 않고 꼭 맞물리는 것이 자신은 믿지 않는 운명론 같았다. 낭만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며 더할 나위 없는 로맨티스트를 가장하고 있었다.
“앞으로 더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찾아내고 싶어.”
과연 창백하게 식은 겨울 바다를 빛내는 별다운 말이었다.
‘찾아낼 수 있을까.’
토아는 속으로 나도 나를 모르는데 과연 너에게 나를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럼 언젠가는 토아가 좋아하는 게 가득한 생일 상도 내가 만들 수 있겠지? 너무 즐겁겠다. 빨리 토아가 활짝 웃는게 보고싶어.”
나는 무얼 고민한걸까. 이미 내가 모르는 시즈루 토아를 호시노 아카리는 알고 있다. 찾아낼 수 있다는 그 행위는 이미 증명되었고, 그것은 애정에 기반한 호기심이었으며, 호시노 아카리라는 사람 안에 자신이 차오르는 과정이었다. 계속해서 나를 궁금해하며 관찰하고 지켜보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며 그 속에서 그 순간만큼 그 모든 행위에 자신이 중점이었다. 그는 남이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기껍지 않으나 그녀는 예외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는데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면 그건 분명히 눈앞의 사람과의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